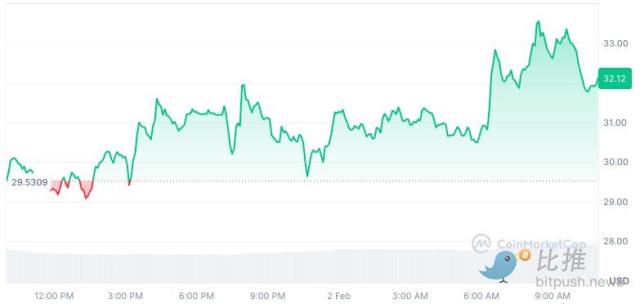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1월부터 코인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과세 준비가 현실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에서 과세 유예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세법 개정 방향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1월 1일부터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거나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은 관련 정보와 증빙 자료를 국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행정예고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세부 이행 규정에 따른 후속 단계다. CARF는 영국, 독일, 일본 등 48개국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 공조 체계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여기에 편입됐다.
CARF가 본격 가동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외국인(비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OECD 시스템에 공유된다. 동시에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도 해외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거래’ 모두 국세청의 확인 범위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거래 내역까지 과세 인프라 안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CARF 도입에 맞춰 본인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FIU는 지난해 말 코빗에 대해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두고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총수입 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예컨대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해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16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코인 과세가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과세 인프라 미비, 시장 반발 등이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도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발표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코인 과세 유예가 포함될지, 하반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출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세법 소관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유예는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 과세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 혼란이 커지고, 반복적인 유예로 제도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